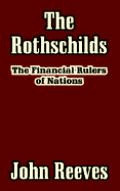"얘야, 하버드대엔 붙어도 가지 마라"
유명대 복수합격해도 주립대 보내는 사람들
"아이가 하버드대에 붙으면 보내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의 한국 부모들은 뭐 이런 멍청한 질문이 다 있냐는 표정을 지을 것이다. 당연히 보내지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는 표정 말이다.
하지만 학비만 연간 7000만원에 육박하고 각종 교재비와 생활비를 합해 연간 1억원이 넘는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면 어떨까. 4년간의 대학 교육에 4억~5억원의 비용을 써야 하는데도 집 팔고 빚 내서라도 보내겠다고 대답할까.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WSJ)에 '대학을 지원하는데 비용이 변수가 될까'란 칼럼이 실렸다. 네 딸 가운데 첫 딸을 대학에 보내게 된 엄마 기자가 자신의 경험으로 쓴 글이다. 이 글을 쓴 데미트리아 갤리고스는 딸이 여러 대학으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아 다른 부모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지만 내심 딸이 어떤 대학을 고를지 걱정이 된다고 고백했다.
"대학 학비는 어느 정도일까?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좋은 대학에 딸이 합격하면 어떻게 할까? 딸이 실망하지 않도록 미리 (재정적으로) 갈만한 대학 후보들을 제시해주고 기대를 낮춰줘야 하는 것은 아닐까?"
가까운 지인이 아이비리그에 충분히 입학할 수 있는 딸을 학비가 저렴한 주립대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설명을 듣고 보니 '과연'하고 고개가 끄덕여졌다. 이 분의 논리는 아이비리그는 비싼 학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부잣집 아이들이나 장학금으로 학비를 거의 내지 않고 다닐 수 있는 특출나게 뛰어난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라는 것이다. 중산층 출신의 평범한 학생이 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허리 휘어지도록 비싼 학비를 부담하며 다닐만한 학교는 아니라는 것이다.
많은 부모들이 여전히 간판 좋은 대학에 자녀가 붙기만 하면 돈은 어떻게 해서라도 마련해 보내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간판 좋은 대학은 그만한 값을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난주 발표된 미국 올스테이트-내셔널 저널 하틀랜드 모니터의 설문조사 결과는 대학을 졸업해도 뾰족한 수가 없는 중산층의 현실을 보여준다.
이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54%는 중산층이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했다. 또 3분의 1은 한때 중산층의 기본 요건으로 여겨지던 매년 떠나는 휴가 여행과 임금 상승, 적절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 직업 안정성 등이 상류층에게나 가능하다고 답했다.
조사를 진행한 내셔널 저널의 편집이사인 로널드 브라운스타인은 "사람들은 더 이상 몇 년 전보다 생활이 나아졌는지 묻지도 않고 그럴 수 있다고 기대하지도 않는다"며 "밑바닥으로 추락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현 상황을 묘사했다.
명문대를 졸업한다 한들 엄청난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이나 직장은 그리 많지 않다. 월급 받아봤자 간신히 현 상태를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게 대다수 직장인들의 현실 고백이다.
이는 옛날처럼 명문대 졸업해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착실하게 월급 받아 집 사고 집 늘리면서 저축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났다는 의미다. 명문대가 인생역전의 지름길, 개천에서 용이 될 수 있었던 수단이었던 시절은 사실상 끝났다.
대학도 간판보다는 학비와 장학금 혜택을 감안한 비용 대비 수익률, 즉 졸업생들의 취업률과 평균 연봉을 고려해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